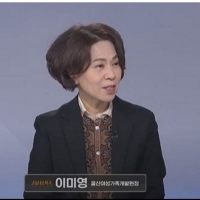![[시론] 시험대 오른 삼성전자 반도체 경쟁력](https://img.hankyung.com/photo/202103/07.14227936.1.jpg)
상업세계는 변화무쌍하다. 기술변화라는 물결과 바람의 향배를 읽지 못하면 잘나가던 기업도 난파선이 되기 십상이다. 노키아의 몰락이 이를 웅변하고 있다. 지난 2월 18일 현재 한국의 삼성전자 시가총액(4973억달러·약 560조원)이 대만의 반도체 수탁생산회사 TSMC(5685억달러·약 640조원)에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대만의 국내총생산과 자본시장 규모 차이를 감안하면 충격적이다.
TSMC는 미·일 반도체 협정이 체결된 다음해인 1987년에 설립됐다. 당시 세계 반도체 시장은 일본 기업이 장악했다. 위기의식을 느낀 미국이 일본을 압박해 반도체 시장을 인위적으로 재편한 것이 반도체 생산의 ‘수직분업화’다. 부가가치가 높은 반도체 설계 등 상류산업(up stream)은 미국 기업이 갖고, 거액의 투자가 필요하지만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하류산업(down stream)은 아시아에 넘긴다는 구상이다. 미·일 반도체 협정에서 거대한 기회를 읽은 인물이 TSMC의 창업자 모리스 창 전 회장이었다. TSMC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었지만 실리를 택했다.
반도체 생산의 생태계도 크게 변했다. 팹리스(Fabless), 즉 설계에서 파운드리(Foundry), 즉 생산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했다. 애플, 아마존, 테슬라, 페이스북 등 소위 기술 기업들은 ‘자사 제품에 적합한 반도체’를 직접 설계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사양의 반도체를 적기에 생산해줄 수 있는 수탁업체를 필요로 하게 됐다.
파운드리 시장이 커지면서 자체개발을 하지 않고 수탁생산만 하겠다는 TSMC의 전략, 즉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라는 포지셔닝은 ‘신의 한 수’가 됐다.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아버린 TSMC에는 설계도를 넘겨도 기술유출에 대한 걱정이 상대적으로 덜하기에 많은 기업들이 TSMC를 선호했다. 반면 자체개발을 겸업하는 종합반도체 회사인 삼성전자와 반도체 굴기 등으로 자체개발 기술력 확보에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중국의 팹(FAB) 기업들은 그만큼 불리할 수밖에 없게 됐다.
파운드리만을 놓고 보면 TSMC는 삼성전자를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 빅테크 기업인 애플, 테슬라, AMD 등이 TSMC의 주요 고객이다. 종합반도체 회사 인텔도 자사가 물량을 다 소화하지 못하면 TSMC에 외주를 맡길 만큼 거래의 신뢰를 쌓았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는 일천하다. 반도체를 생산하는 DS(device solution) 부문에서 2017년 5월에서야 독자적인 사업부로 분리됐다. 2020년 기준으로 TSMC와 삼성전자 파운드리 시장점유율은 55.6% 대 16.4%다.
파운드리의 기술경쟁은 ‘회로의 선폭’을 좁히는 것이다. 나노(nano)가 기본 단위다. 5나노 이하의 제품을 만들려면 극자외선장비가 필요한데 네덜란드 ASML만이 1년에 20여 대씩 독점생산하고 있다. 일찍이 파운드리에 뛰어든 TSMC가 더 많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다. 시장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회로의 선폭 포트폴리오가 다양한 TSMC가 상당히 유리한 것이 현실이다.
한국인의 뇌리에 삼성전자는 반도체의 지존기업으로 각인돼 있다. 하지만 이는 ‘과거 시제’이고 또 메모리반도체에 국한된 것이다. 2019년 현재 삼성전자가 절대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메모리반도체의 시장점유율은 전체 시장의 27%에 지나지 않는다. 삼성전자는 과거 치킨게임으로 경쟁업체를 몰아냈지만 비메모리 시장은 사정이 다르다. 인공지능, 5G 통신기술, 자율차가 보급될수록 주문형 생산인 파운드리 비중은 커지게 된다. 더욱이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고객과 경쟁’하는 사업구조다. 계열분리 등의 특단의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설상가상으로 총수마저 부재다.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시험대에 올라 있다.


 김진혁(27회) 심플...
김진혁(27회) 심플...
 [과학의달인] 흡입...
[과학의달인] 흡입...